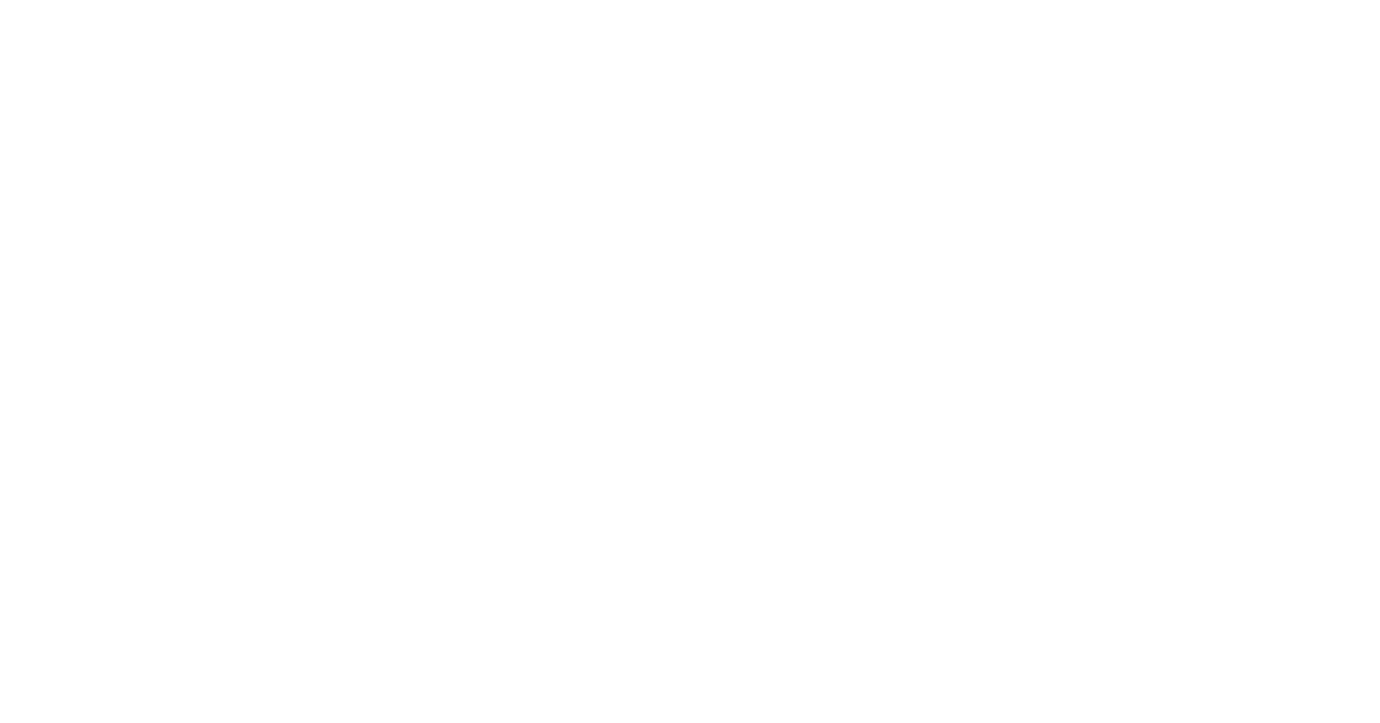이주영, Lee Joo Young
2021년 1월 8일(FRI) -1월 28일(THU)
January 8 – January 28, 2021
해움미술관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속 시민들의 표정을 콘테로 그려 낸 이주영 작가의 콘테전 <지동교, 봄>이 개막한다.
지난 해 2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작가 이주영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삶을 지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을 콘테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 표정들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인내와 희망과 고뇌가 묻어 난다.
이주영 작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민중미술운동에 뛰어 들었고 1993년까지 7년여의 시간을 오롯이 그 운동에 헌신했던 작가이다. 목판모임 판, 수원문화운동연합 시각예술위원회, 미술동인 새벽, 우리들의 땅, 수원미술인협의회(수미협)에서 활동했고, 수미협의 회장을 역임했다.
1990년대 중후반 잠시 미술을 놓았다가 2003년부터 전업작가로 복귀했고, 이후 한 해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그가 바라본 곳들은 그의 삶이 그랬듯이 가난하고 그늘진 풍경이었다. 그곳은 삶의 가장자리였다. 재개발 철거촌에서 시작된 그의 눈은 후미진 골목과 오래된 마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집들, 나무들, 사람들에 꽂혔다.
새카만 콘테로 그린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먹하다. 삶의 활기가 사라진 표정들은 가눌 수 없는 곳들을 응시한다. 그곳에는 희망도 절망도 그 어떤 열망도 없는 듯하다. 어제와 내일이 끼어 들 수 없는 ‘오늘’이 막다른 현실로 얼비치는 얼굴들이다. 그 얼굴에서는 그동안 미술사적 개념으로만 치부해 두었던 ‘민중’이 떠오르기도 한다.
미술평론가 김종길은 이 그림들에 대해 “아, 어쩌면 이토록 생생한 현실이란 말인가! 이주영은 거침없이 그렸다. 그들의 자리를 회화로 옮겨 와 당당한 미학적 주체로 세웠다. 그들이 서 있는 회화적 자리는 더 이상 빈 곳이 아니었다. 그 눈빛, 그 포즈, 그 표정, 그 손짓과 그리고 앙 다문 입은 삶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했다.
Information
<작가노트>
2월28일
오래된 구도심 수원의 팔달문과 재래시장이 모여 있는 곳. 지동교와 시장 주변의 길에서 마주치는 표정들 속에 코로나19를 마주하는 두려움과 경계의 모습이 묻어난다. 저들 안에 내가 있음을 느낀다.
3월11일
길 위의 표정들을 장지에 콘테로 기록한다. 한 명 한 명의 눈빛과 몸짓에서 절절한 소리가 들린다. 더 많은 소리를 담자.
3월24일
구도심의 사람들-
오랜 시간 익숙한 정서에 맞춰 중장년층과 도시서민 노점상 노숙인 시위 하는 이 등이 뒤섞여 다른 곳에선 보기 어려운 낯선 풍경과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그들 속에서 먹먹해지는 나를 느낀다. 일일이 알 수는 없으나 그냥 우두커니 정지된 한 컷의 흑백사진을 보는듯한 착각에 빠진다.
4월2일
검은색은 있건 없건 어리거나 늙은이던 간에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들은 다 같고 아리고 애틋하며 고맙고 미안하다. 보면서 듣고 말없이 가슴으로 울린다. 다리위에선 멀어지거나 만나거나 난간 끝에 서있거나 눕기도 하구 술도 한잔하구… 수많은 색들이 다리에 있다.
4월14일
사람을 그린다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
숨은 미안함이 가득한 날이다.
5월1일
지동교 위엔 여전히 바람에 노출된 흔들리는 영혼들이 초점 잃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불확실한 내일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다. 어제가 내일인 이들을 감히 예단하거나 건방진 미안함을 경계하며 내가 그리는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나의 진정성의 몫이다.
매일이 흔들린다.
6월4일
다리위의 삶
너 혹은 나
부여잡거나 간신히 간절히…
기대거나 차라리 눕거나
가장 낮고 좁게
7월14일
붙잡아 손 사레 치고
중력에 매달리고
큰소리로 침묵하고…
피곤하다
8월21일
고맙구 미안하구 또 미안하구…
날일들일 한두 번두 아닌데
감사할 일 인 데두 한구석 덜지 못한 끈적한 미안함이란…
맑은 영혼의 한걸음을 새긴다
전시평론
김종길 미술평론가
2020년 코로나 상황은 사람들 스스로를 좌절 시키며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전대 미문의 이 사태는 국가/정부 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위기이고 공포다. 국가/정부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강조할 뿐이다. 어쩌랴, 그래도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마스크 하나에 기대어 일상을 지속한다. 이주영의 눈은 바로 이렇게 일상을 지속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가 닿았다. 지동시장 앞 지동교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일상 조차도 때때로 지속할 수 없는 ‘떠밀린 무리’였다. 그들을 밀어낸 주체는 국가/정부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기도 했다. 코로나는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더 힘든 현실로 바꾸었을 뿐이다.
새까만 콘테로 그린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먹 했다. 삶의 활기가 사라진 표정들은 가눌 수 없는 곳 들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희망도 절망도 그 어떤 열망도 없는 듯했다. 어제와 내일이 끼어 들 수 없는 ‘오늘’ 이 막다른 현실로 얼 비치는 얼굴 들이었다. 나는 그 얼굴에서 그동안 미술사적 개념으로만 치부해두었던 ‘민중’을 떠올렸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민중이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쳤다. 그들은 21세기 내내 ‘노동자’, ‘상처받은 공동체’ 에 집중했던 후기 민중미술의 대상이나 실체도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삶이 구멍 난 곳의 잉여지, 섬, 귀퉁이, 혹은 텅 빈 어떤 자리 들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대추리, 용산, 콜드콜텍, 제주 강정, 밀양처럼 사건화 된 장소들이 아닌, 일상이라는 ‘지금, 여기’ 의 가장 근거리의 현실이었다. 아, 어쩌면 이토록 생생한 현실이란 말인가! 이주영은 거침없이 그렸다. 그들의 자리를 회화로 옮겨 와 당당한 미학적 주체로 세웠다. 그들이 서 있는 회화적 자리는 더 이상 빈 곳이 아니었다. 그 눈빛, 그 포즈, 그 표정, 그 손짓과 그리고 앙 다문 입은 삶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